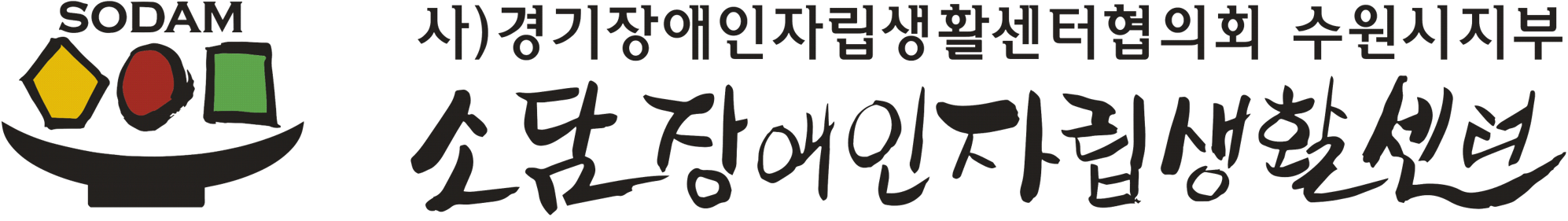0120 천 일의 아침,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 출근길 지하철 행동 천 일을 맞아 고병권(읽기의집/노들장애학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담센터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1-22 09:59본문
천 일의 아침,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행동 천 일을 맞아
고병권(읽기의집/노들장애학궁리소)
1.
오늘은 천 일의 아침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행동, 그 천 번째 아침입니다. 그냥 천 일이 아니고 가로막히고 끌려나온 천 일입니다. 그냥 천 일이 아니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특정장애인단체’로 불려온 천 일입니다. 천 일의 아침은 혐오와 욕설의 아침이기도 했고, 전동휠체어의 전원이 뽑힌 채 경찰서에 끌려갔던 아침이기도 했습니다. 플랫폼에서 모두가 머리를 삭발하며 울먹였던 날, 객실 바닥을 기어가며 시민들의 발목에 대고 외치던 날, 하루종일 돌덩어리처럼 플랫폼에 내팽겨쳐진 채 장애인에게 문을 열지 않는 열차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날들까지 더해서 천 일입니다.
지상의 시간과 지하의 시간, 비장애인의 시간과 장애인의 시간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지난 천 일 동안 지상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내란이 일어났고 정권이 교체되어 또 다른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에 있는 우리의 천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 일의 아침, 우리의 구호는 똑같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동네에서 함께 살게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천 일은 더 오래된 것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과 2002년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었을 때, 2002년 이명박 시장은 2004년까지 서울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22년이 지난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천 일은 이보다도 더 오래된 것입니다. 1984년 김순석 열사가 당시 염보현 시장에게 요구했던 이동권을 우리는 2026년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하염없는 시간의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2년, 현실을 당장에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한 장애인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서른 살이 넘었습니다. 집에서 서른 살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어렵게. … 지금 현실이 안 좋으니 현실을 인정해라, 인정해라고만 하는데, 저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모든 인생이 끝나버릴 텐데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또 사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 일이 흐르고, 천 일이 흐르고, 또 천 일이 흐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장애인들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천 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만 우리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의 아침도 투쟁 없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천 일은 연대의 천 일이기도 했고, 무관심의 천 일은 각성의 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개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쓰는 칼럼인데 다음 글이 100번 째입니다. 그러니 100 달 정도 쓴 셈입니다. 제가 칼럼 연재를 결심한 것은 2016년 겨울입니다. 광화문역 농성이 1500일을 지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글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신문에 칼럼 쓰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들어 온 요청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단 장애인들의 투쟁에 대해서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500일이 지나서야 달궈진 인간도 있는 겁니다. 천 일동안 세상은 그대로입니다만, 천 일째 되는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깨어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세상과 마주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만 매일 아침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2.
천 일의 아침,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자 한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통증일기⟫라는 첫 시집을 낸 박정숙 시인입니다. 박 시인은 오랫동안 노들장애인 야학의 학생이기도 합니다. 어느날 수업시간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병*이라는 말, 세상에 왜 나왔느냐는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나는 정말 잘 죽기 위해 살아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잘 죽기 위해 살다니요.
그런데 시집을 읽고서 그리고 시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서야 이 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 <나는 지금 아프다>에는 ‘고리짝만 한 외로움들’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살던 집 안방 구석에는 작은 고리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열쇠를 채워두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 고리짝. 어린 정숙은 그 고리짝에 무슨 보물이 들어있을지 궁금했답니다. 어느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린 정숙 앞에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농약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정숙에게 ‘같이 죽자’고 말했답니다.
박 시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답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라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이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십대 장애인 소녀는 같이 죽자던 아버지를 피해 새벽녘 목발을 짚고 산 하나를 넘어 도망쳤습니다. 이제 60대인 소녀는 여전히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어서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해방열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던 김순석, “복수해달라”고 했던 최정환, 어린 아들에게 “꼭 너하고 살려고 했는데, 네가 보고 싶구나”라고 썼던 최옥란, 그리고 1년 전 우리를 떠난, ‘행복의 나라로’를 부르던 정지민까지, 이 죽은 사람들조차 죽을 수 없어서, 지금 여기 우리 마음에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살아야겠습니다. 버스랑 지하철도 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시설 아닌 동네에서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장 소박한 요구로 가장 급진적인 혁명가가 되고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매일의 다짐이 혁명의 맹세가 되고만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나는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십대 소녀가 지난 50년 동안 반복했을 아침의 다짐을 인용하며 천 일의 아침,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집 ⟪통증일기⟫의 마지막 쪽에 있는 싯구입니다.
“장애인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오늘을 살아간다 세상은 거대한 혐오의 눈으로 다가오기에 호흡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 숨결마다 투쟁해야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매일 아침 호흡을 가다듬고 살아야겠습니다. 호흡마다 기도하며, 숨결마다 투쟁하며, 어제 아침도, 오늘 아침도, 내일 아침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길 지하철 행동 천 일을 맞아
고병권(읽기의집/노들장애학궁리소)
1.
오늘은 천 일의 아침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행동, 그 천 번째 아침입니다. 그냥 천 일이 아니고 가로막히고 끌려나온 천 일입니다. 그냥 천 일이 아니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특정장애인단체’로 불려온 천 일입니다. 천 일의 아침은 혐오와 욕설의 아침이기도 했고, 전동휠체어의 전원이 뽑힌 채 경찰서에 끌려갔던 아침이기도 했습니다. 플랫폼에서 모두가 머리를 삭발하며 울먹였던 날, 객실 바닥을 기어가며 시민들의 발목에 대고 외치던 날, 하루종일 돌덩어리처럼 플랫폼에 내팽겨쳐진 채 장애인에게 문을 열지 않는 열차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날들까지 더해서 천 일입니다.
지상의 시간과 지하의 시간, 비장애인의 시간과 장애인의 시간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지난 천 일 동안 지상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내란이 일어났고 정권이 교체되어 또 다른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에 있는 우리의 천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 일의 아침, 우리의 구호는 똑같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동네에서 함께 살게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천 일은 더 오래된 것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과 2002년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었을 때, 2002년 이명박 시장은 2004년까지 서울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22년이 지난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천 일은 이보다도 더 오래된 것입니다. 1984년 김순석 열사가 당시 염보현 시장에게 요구했던 이동권을 우리는 2026년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하염없는 시간의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2년, 현실을 당장에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한 장애인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서른 살이 넘었습니다. 집에서 서른 살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어렵게. … 지금 현실이 안 좋으니 현실을 인정해라, 인정해라고만 하는데, 저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모든 인생이 끝나버릴 텐데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또 사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 일이 흐르고, 천 일이 흐르고, 또 천 일이 흐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장애인들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천 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만 우리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의 아침도 투쟁 없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천 일은 연대의 천 일이기도 했고, 무관심의 천 일은 각성의 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개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쓰는 칼럼인데 다음 글이 100번 째입니다. 그러니 100 달 정도 쓴 셈입니다. 제가 칼럼 연재를 결심한 것은 2016년 겨울입니다. 광화문역 농성이 1500일을 지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글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신문에 칼럼 쓰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들어 온 요청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단 장애인들의 투쟁에 대해서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500일이 지나서야 달궈진 인간도 있는 겁니다. 천 일동안 세상은 그대로입니다만, 천 일째 되는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깨어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세상과 마주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만 매일 아침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2.
천 일의 아침,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자 한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통증일기⟫라는 첫 시집을 낸 박정숙 시인입니다. 박 시인은 오랫동안 노들장애인 야학의 학생이기도 합니다. 어느날 수업시간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병*이라는 말, 세상에 왜 나왔느냐는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나는 정말 잘 죽기 위해 살아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잘 죽기 위해 살다니요.
그런데 시집을 읽고서 그리고 시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서야 이 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 <나는 지금 아프다>에는 ‘고리짝만 한 외로움들’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살던 집 안방 구석에는 작은 고리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열쇠를 채워두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 고리짝. 어린 정숙은 그 고리짝에 무슨 보물이 들어있을지 궁금했답니다. 어느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린 정숙 앞에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농약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정숙에게 ‘같이 죽자’고 말했답니다.
박 시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답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라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이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십대 장애인 소녀는 같이 죽자던 아버지를 피해 새벽녘 목발을 짚고 산 하나를 넘어 도망쳤습니다. 이제 60대인 소녀는 여전히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어서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해방열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던 김순석, “복수해달라”고 했던 최정환, 어린 아들에게 “꼭 너하고 살려고 했는데, 네가 보고 싶구나”라고 썼던 최옥란, 그리고 1년 전 우리를 떠난, ‘행복의 나라로’를 부르던 정지민까지, 이 죽은 사람들조차 죽을 수 없어서, 지금 여기 우리 마음에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살아야겠습니다. 버스랑 지하철도 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시설 아닌 동네에서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장 소박한 요구로 가장 급진적인 혁명가가 되고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매일의 다짐이 혁명의 맹세가 되고만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나는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십대 소녀가 지난 50년 동안 반복했을 아침의 다짐을 인용하며 천 일의 아침,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집 ⟪통증일기⟫의 마지막 쪽에 있는 싯구입니다.
“장애인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오늘을 살아간다 세상은 거대한 혐오의 눈으로 다가오기에 호흡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 숨결마다 투쟁해야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매일 아침 호흡을 가다듬고 살아야겠습니다. 호흡마다 기도하며, 숨결마다 투쟁하며, 어제 아침도, 오늘 아침도, 내일 아침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0128 400여년 전 눈 먼 시인이 쏘아 올린 불꽃이... 김성수 인물로 본 세계사 26.01.31
- 다음글0117 "장애인 주차구역 줄여도 문제 없다" 조례 개정 추진 '시끌' 26.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